“기미년 삼월일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
<1919년 3월 1일, 조선 근대사에서 이날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이 붕어, 이날은 장례식 날이었다. 1910년 일본과의 병합을 반대하다 퇴위당한 인물이었던 만큼 그를 애도하는 조선민중의 마음에는 민족심이 들끓어 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 3월 1일, 서른 세 명의 조선 지식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내외에 독립을 선언했다. 이를 계기로 경성의 파고다 공원에 모여 있던 민중들은 시가로 나가 ‘독립만세’를 외치며 대대적인 시위행진을 벌였고 각지에서 경찰들과 충돌했다.>
<독립을 바라는 목소리는 들불처럼 조선 전토로 번져나갔다. 이것이 바로 당시는 ‘만세사건’이라 불리다 후에 ‘3·1운동’이라 불리게 된 민족운동이었다. 5월 말까지 만세 소리는 1,500번 이상 울렸으며, 200만 명이나 되는 조선 사람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사람이 아닌 일본인 작가 다고 기치로(多胡吉郞·64)씨가 쓴 소설 <야나기 가네코, 조선을 노래하다>(박현식 譯)에 담긴 내용이다. 10년 전에 나온 소설이지만 삼일절을 맞아 다시금 열어봤다. 일본 NHK 프로듀서 출신인 다고 기치로 씨는 작가로 변신해서 글을 쓰고 있다.
이 소설은 한국 문화를 남다르게 좋아했던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1889-1961)의 부인인 성악가 야나기 가네코(柳兼子·1892-1984)의 조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엮었다.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본다. 1920년 5월 4일 저녁 종로의 기독교 청년회관의 상황이다.
한국 사람이 아닌 일본인 작가 다고 기치로(多胡吉郞·64)씨가 쓴 소설 <야나기 가네코, 조선을 노래하다>(박현식 譯)에 담긴 내용이다. 10년 전에 나온 소설이지만 삼일절을 맞아 다시금 열어봤다. 일본 NHK 프로듀서 출신인 다고 기치로 씨는 작가로 변신해서 글을 쓰고 있다.
이 소설은 한국 문화를 남다르게 좋아했던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1889-1961)의 부인인 성악가 야나기 가네코(柳兼子·1892-1984)의 조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엮었다.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본다. 1920년 5월 4일 저녁 종로의 기독교 청년회관의 상황이다.
소설 속으로...조선 최초의 서양 음악회
야나기 가네코는 아직은 서양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인 만큼 전개의 강약에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조선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이 한층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근심에 잠긴 얼굴에 빛이 비치고, 근심으로 찌그러진 눈썹이 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노래에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청년 회관은 수용인원이 1,300명이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 장소 정리 때문에 한 시간이 늦은 8시에 음악회가 시작됐다. 이날의 음악회는 조선 최초의 서양 독창회였다.
오후 8시, 드디어 주최자인 동아일보사를 대표하여 염상섭(사회자)이 무대에 올랐을 때 기대에 부푼 가슴을 안고 있던 청중들의 열기로 회장은 후끈 달아 있었다. 가네코는 남색 바탕에 오동나무 꽃을 수놓은 아름다운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산들바람이 속삭이는 듯 한 피아노 전주에 이어서 향수에 가득 찬 달콤한 멜로디를 노래하는 가네코의 목소리가 흐르기 시작했다.
“오렌지 꽃이 피는 나라를 아시나요?
금 빛 과실과 장미의 나라를
미풍이 조용히 불고, 새가 경쾌하게 노래하는 나라를"
시작은 가극 <마뇽> 중 ‘그대는 아는가, 저 남쪽 나라를’과 ‘불쌍한 아이가 먼데서 왔다’라는 아리아 두 곡이었다. 가네코의 목소리는 때로는 높고 때로는 낮게 자유로이 음정을 바꾸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았다. 약한 음이 포르테로 바뀌고 단조가 장조로 바뀔 때마다 구름에서 벗어나 반짝이기 시작하는 태양의 빛을 느꼈다.
가네코의 마음에는 들꽃처럼 소박하고 깨끗하며 진지함이 넘쳐났다. 때로는 애수를 머금고, 고독과 절망에 좌절해도 그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희망의 서광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서러운 조선인들에게 바치는 노래
가네코가 슈베르트의 가곡을 부르는 것은 ‘서러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조선 사람들에게 노래를 바치겠다’는 그녀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음악임과 동시에 시의 세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기도의 차원으로 승화된 것이었다.
“내가 한탄할 수 있겠는가, 주저할 수 있겠는가
당신과 나의 모습에, 어찌할 바 몰라 할 수 있겠는가
아니, 이 가슴에 당신의 하늘을 품자
그리고, 그 마음이 꺾이기 전에, 다시 당신의 반짝임을 마시고,
당신의 빛을 빨아들여야지"
‘폐허와 같은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곡에서 삶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희망의 빛을 붙들었으면...’
가네코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그리고 따뜻하고 절실하게 노래를 불렀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일 관계는 평행선을 그으면서 대립하고 있다.
“노래는 언제나 자유로워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소설 속에 담긴 야나기 가네코의 말에 답이 있을 듯싶다. 이는 곧 작가 다고 기치로 씨의 말이기도 하다.
“허탈함에 빠져 있던 조선 사람들의 마음에 그녀의 노래는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고 영혼을 감동으로 뒤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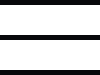
















.jpg)
독자댓글 총0건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