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격자’에서 ‘개척자’로 변해야 한다는 얘기가 자주 들린다. ‘빠른 추격자’로서의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빠른 개척자’로 변신해야 경쟁에서 이기고 미래를 이끌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산업화가 늦었다.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자마자 참혹한 전쟁까지 치른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는 살아남는 것이었다. 그래서 남을 따라잡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경제·학문·문화·예술·스포츠 등 대부분 분야가 그랬다.
그런 노력 덕분에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올랐고,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에 이르렀다. ‘빠른 추격자’로서 우리가 이룩한 성취는 세계 속의 ‘코리아 브랜드’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추격자는 아무리 빨라도 개척자가 누리는 지위에는 결코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빠른 추격자’를 버리고 ‘개척자’로 하루빨리 변신해야 한다는 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간절한 소망과 노력만 있으면 개척자가 될 수 있을까. 영어로 ‘first mover’ ‘fast follower’라고 하면 마치 달리기에서 ‘일등’과 ‘일등을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달리는 2~3등’으로 해석되기 쉽다. 그래서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개척자’의 다른 표현은 ‘오솔길을 내는 사람(trailblazer)’이다.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숲이나 황무지를 지나가면서 최초로 길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킨다. 육상 트랙에서 2등 앞에서 달리는 1등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다.
길이 없는 우거진 숲 속을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안다. 덩굴과 가시가 우거지고, 바닥은 나뭇잎에다 잡초가 무성해 한 걸음도 전진하기가 쉽지 않다.
개척자에게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은 불확실성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 숲을 헤치고 나아간 곳에 원하는 목적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 길을 내는 사람이 개척자다. 개척자가 주로 활동하는 무대는 ‘트랙’이 아니라 ‘정글’이다.
우리는 산업화가 늦었다.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자마자 참혹한 전쟁까지 치른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는 살아남는 것이었다. 그래서 남을 따라잡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경제·학문·문화·예술·스포츠 등 대부분 분야가 그랬다.
그런 노력 덕분에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올랐고,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에 이르렀다. ‘빠른 추격자’로서 우리가 이룩한 성취는 세계 속의 ‘코리아 브랜드’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추격자는 아무리 빨라도 개척자가 누리는 지위에는 결코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빠른 추격자’를 버리고 ‘개척자’로 하루빨리 변신해야 한다는 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간절한 소망과 노력만 있으면 개척자가 될 수 있을까. 영어로 ‘first mover’ ‘fast follower’라고 하면 마치 달리기에서 ‘일등’과 ‘일등을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달리는 2~3등’으로 해석되기 쉽다. 그래서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개척자’의 다른 표현은 ‘오솔길을 내는 사람(trailblazer)’이다.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숲이나 황무지를 지나가면서 최초로 길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킨다. 육상 트랙에서 2등 앞에서 달리는 1등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다.
길이 없는 우거진 숲 속을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안다. 덩굴과 가시가 우거지고, 바닥은 나뭇잎에다 잡초가 무성해 한 걸음도 전진하기가 쉽지 않다.
개척자에게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은 불확실성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 숲을 헤치고 나아간 곳에 원하는 목적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 길을 내는 사람이 개척자다. 개척자가 주로 활동하는 무대는 ‘트랙’이 아니라 ‘정글’이다.
그래서 학문이든, 산업이든, 예술이든 모든 분야의 개척자는 위험하고 고독하며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늘 안고 살아야 한다. 성공하면 찬사가 쏟아지지만, 실패하면 모든 비난과 책임을 뒤집어써야 한다. 법적·도의적 책임도 따른다.
더 높은 단계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개척자가 많아야 한다는 주장은 분명히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는 구호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많은 투자와 시간과 노력이 필수다.
그와 더불어 모험심을 높이 평가하고 최선을 다하고도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적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절실하다. 도전하는 사람에게 실패의 모든 책임을 묻고 낙인까지 찍으면 누가 개척자로 나서려고 하겠는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려는 사람들만 있는 사회에서는 결코 개척자가 나올 수 없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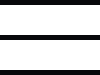
















.jpg)


.jpg)
독자댓글 총0건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