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람과 설렘이 없는 시를 반성한다. 9년 묵은 연인의 설익은 권태처럼 혹은 ‘나타(懶楕)와 안정’(김수영, 「폭포」)에 취한 부르주아지의 늘어진 오후처럼 반복과 재인(再認)의 시를 반성한다. 언제부턴가 나의 시는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고 설레게 하지 않았다. 또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주의 첫 순간을 맞이하는 언어의 시퍼런 감각을 시라고 할 수 있다면 내 언어의 권태와 나타와 안정은 이미 내가 마신 독극(毒劇)의 표징이 아닐 수 없다. 내가 만일 통회(痛悔)의 길을 걸어서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은 ‘행복의 나라’가 아니라 ‘모르는 나라’여야 한다.
살불살조(殺佛殺祖)든 배신이든 혁명이든 ‘반성하는 시인’은 극한에 목말라야 한다. 맨 처음으로 돌아가든가, 끝으로 내달려야 한다. ‘길을 찾는 여행’은 중단도 없으며 완성도 없고 마무리도 없다. 시인은 오직 자신에게 길을 묻는다. 시인은 영원히 질문하는 자이며, 영원히 길을 찾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참다운 반성이 자신의 내면에 드리운 검은 그늘을 폭로하는 것이라면 ‘시인의 반성’은 더욱 가혹해도 좋겠다. “나는 진실했는가.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겪은 것에 나는 나를 바쳤는가. 나는 누구인가?"(「시인의 말」, 『주름, 펼치는』, p.5, 문학수첩, 2017)
길은 가도 가도 직선, 나의 길
세찬 비와 모래바람과 해일 폭풍 쯔나미
마리아나 제도 솔로몬 군도 유카탄 반도를 향해
곧바로 뻗은 길
나는 이제 모르는 길
갈 수 없는 길 가로막힌 길을 뚫기 위해
상어 뱀장어 불가사리 키조개 홍합 왕새우에게
길을 묻지 않겠다
- 졸시, 「길을 묻지 않겠다」 중에서
‘문학은 이상한 제도’라며 문학 텍스트는 역사성(일반성)과 특이성(고유성)이라는 이중적이고 분열된 모순적 위상을 갖는다는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는 “철학도 아니고 문학도 아닌 것을, 둘 중 어느 것에도 오염되지 않은 글쓰기를 꿈꾼다."고 했다(「문학이라 불리는 이상한 제도」, 『문학의 행위』, p.100, 문학과지성사, 2013). 데리다가 꿈꾸었던 것은 맨 처음이자 동시에 마지막인 글쓰기였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오직 순수한 ‘하나’의 글쓰기를 꿈꾸었다는 것은 그가 어느 시인 못지않은 시인이었으며, 누구 못지않은 참다운 반성적 주체였다는 말이다.
모르긴 해도 데리다를 그렇게 이끌어 간 상처와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유대인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나치 집권기와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년기를 맞은 것도, 죽음이 두 형제를 먼저 데려 간 것도, 알제리 독립 운동 여파로 프랑스 사회에 번진 셈족에 대한 편견과 폭력도 모두 그를 시적 영혼으로 이끌어 갔을 것이다. 상처받은 영혼은 스스로 ‘문학과 철학 사이에서 망설였다.’(위의 글, p.50)며 자신이 왜 ‘주어진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를 만들고자 했는지 밝혔다. 그는 중심이나 정통에 기거했던 사람이 아니라 주변 혹은 이방(異邦)의 존재였던 까닭이다. 그의 해체주의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근본을 해체하는 것이다.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으랴."(Quelle ame est sans defauts?)라는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꼭 랭보(Authur Rimbaud, 1854-1891)처럼 ‘지옥에서 한철’을 보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데리다와 같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보이는 대로 해체해 버리려고 하는 이방인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상처가 계획의 소산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듯 상처받은 영혼은 언제나 반성을 통해 반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 마련이다. 시인에게 우선적인 것은 상처이며, 상처받은 인간은 시적 인간이다. 그래서 시적 인간은 반성을 통해 상처를 다스리고 위무하는 것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 어렸는지 모른다. 백일장을 쫓아다니며 상장과 상패의 겉멋에 빠져 든 것은 차라리 고딩다운 솔직함이었지만, 내면을 다듬고 가꾸는 반성에 이르기에는 너무 어렸는지 모른다. 놀람과 설렘마저 시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입상(入賞)을 위한 자기 최면에 가까웠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30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진정한 반성에 이르지 못한 데 있다. 반성은 무엇보다 시를 향한 영혼의 고백이어야 하며, 시에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용기이기도 하다. 그러니 반성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배회가 아니어야 하며, 시를 오직 ‘새로운 하나’로 만들려는 불굴의 노력이어야 한다. 시인은 반성하는 인간이다.
보이지 않는 구원의 순간을 위하여 보이는 세계를 힘들여 사는 게 우리의 삶인지 모른다. 시인이 간단없는 반성을 통해 꿈꾸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한 단 하나의 언어이다. 감각도 비유도 이미지도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참다운 반성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보편적 지향이다. 내가 여전히 놀람과 설렘이 있는 시를 갈구한다면, 그것을 향한 나의 반성은 더욱 가혹해도 좋겠다. 그러므로 놀람과 설렘이 없는 나의 모든 일상을 통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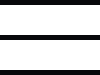


























독자댓글 총0건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