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은 성가퀴다. 비탈진 경사면에 성돌을 쌓고 그 위에 여인의 가르마처럼 지붕을 얹으면 그것이 여장(女墻)이다. 한 여장 아래에는 총안(銃眼)을 뚫어 적을 겨냥케 했는데, 가운데 총안은 방향을 아래로 비스듬히 뚫어 가까이 붙은 적을 쏠 수 있어 근총안이라 부르고, 그 좌우의 두 총안은 방향을 수평으로 내 멀리서 다가오는 적을 겨누게 하니 이는 원총안이다.
여장은 여담이나 여첩(女堞), 타 등으로 불리며 수성전에서 적의 병기로부터 병사를 보호하고 상대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술적 가치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여장과 여장 사이는 끊어져 있는데 이를 타구라고 하며, 우리나라 석성의 타구는 장구 모양으로 되어 있어 시야를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 구조이다.
여장은 또 1396년 조선 태조 때부터 말기 순조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축과 보수가 이루어진 국가적 건설 사업의 기본 계측 단위가 되었다. 총안 세 개를 품고 있는 하나의 여장은 일정한 공사 구간을 산정하는 기준이었다. 그것은 또한 물리적 단위를 넘어 해당 공사 구간을 담당한 관청이나 고을의 표지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실제로 돌을 나르고 괴고 깎은 백성들의 노역의 상징이었다.
이처럼 600년 넘게 단속적(斷續的)으로 이어진 거대한 건축물이 바로 한양 도성이며, 오늘날 서울시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고색창연한 왕조의 유산으로 민족적 자부심과 문화적 긍지의 뿌리가 되고 있다. 한양 도성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도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으며, 한국전쟁 때도 소멸의 화는 겪지 않았다. 또 야음을 틈타 창의문을 넘는 인조반정 군이나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는 일단의 무장공비에게도 1차적으로 맞닥뜨린 방어벽은 여장 아래 시퍼렇게 독을 품은 세 개의 총안이었을 것이다.
청계천의 발원지이기도 한 북악산으로 오르는 길은 여러 곳이지만 서쪽에서는 창의문을 통과하게 된다. 청와대의 배산(背山)으로 입구에서 출입카드를 나눠주는 안내소를 통과하면 곧바로 절벽에 가까운 가파른 계단이 나타난다. 거기서부터 해발 342미터 ‘백악산’(白岳山, 북악산의 다른 이름) 표지석까지 쉬지 않고 오르막이다. 어지간히 운동으로 단련된 사람이라도 한 번쯤 쉬지 않고는 내처 오르기 쉽지 않다.
봄날의 꽃핀 도성을 만끽하려다 숨을 헐떡이며 한참을 오르다 보면, 이런 비탈에서 보초를 서는 일도 쉽지는 않겠지만 적으로서 총칼을 들고 넘어오는 일은 더 고역일 것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정도전(1342-1398)이 왜 하필 이런 곳을 등 뒤에 두고 경복궁을 짓고 한양을 설계하고자 했는지 자연 알 수 있다. 그만큼 북악산의 산세와 성벽의 기울기와 여장과 총안의 방어력은 강력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한양 도성의 강력한 방어력에도 불구하고 임진년에는 왜군의 침공으로 조선의 법궁 경복궁이 불탔으며, 병자년 호란 때는 인조가 삼전도에서 치욕을 당했다. 또한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고, 민족상잔의 전쟁도 막아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나라를 지키는 것은 화강암으로 똘똘 뭉쳐진 성벽이 아니다. 산세도 아니고 여장도 아니고 총안도 아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언제나 그 나라를 지켜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백악산’ 표지석을 정점으로 숙정문까지는 대체로 내리막이다. 가파른 오르막을 오른 끝에 계속해서 내려가는 길은 다리가 후들거린다. 여장과 타구와 총안을 살피며 내려가는 길마다 진달래와 개나리와 벚꽃이 만개했다. 청운대(靑雲臺, 해발 293미터)에서 바라보는 성북동과 멀리 서울 동북쪽의 시가지는 아득해서 아름답기까지 하다.
군데군데 병사들이 지켜 서서 사람들을 살피고 있다. 전투복이 아니라 운동복 같은 차림으로, 적이 아니라 순성객을 살피는 병사들도 잘 알 것이다. 나라는 지키는 것은 너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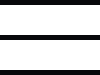











.jpg)

















독자댓글 총0건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