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맑은 날이 있다. 하늘은 높푸르고 햇살 반짝이는, 물결마다 일렁이는 은비늘과 콧날을 타고 오르는 맑은 바람의 날이 있다. 봄눈 지나고 봄비도 그친 다음 유난히 상쾌하고 가벼운 날이 왔다. 대도시 시민들도 오늘은 비록 겨울 외투를 입었을지언정 청량한 기운 속에서 모처럼 밝은 표정을 지었다.
이런 날은 꼭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윤동주, 「序詩」) 맹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저 맑은 기운을 몸속 깊이 받아들인다거나 괜히 자신을 정화하고 싶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것은 외부 자연의 자극에 대한 내부의 반응이라기보다 이미 자연의 일부인 인간의 그야말로 자연스런 ‘스스로 그러함’일지 모른다.
만일 자연과 인간의 진정한 합일이 있다면 이런 맑은 날의 의식되지 않는 심호흡일 거라는 생각을 하며 길을 걸었다. 을지로2가에서 명동성당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은 마침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의 분주한 걸음으로 가득 찼다. 또한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복잡하기까지 했다. 종횡사해(縱橫四海)라면 이런 것이겠다.
부활절을 꼭 한 달 앞둔 금요일, 나는 고백성사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 부활절과 성탄절을 앞두고 의무적으로 받는 판공성사를 보러 가는 길이었다. 명동대성당 종탑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계단은 마치 세속과 하늘의 경계인 듯 위아래 풍경을 매우 다르게 가르고 있었다. 분주하고 복잡한 아래쪽과 달리 대성전 앞마당은 한산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도시인의 삶에서 금요일 한낮이라면 확실히 성당보다는 일상적 공간에 있어야 할 것이었다.
고해소 앞은 더욱 한산했다. 대성전과 꼬스트홀, 성모 동산 주변에는 기념사진을 찍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지만 옛 계성여고 자리로 옮긴 상설고해소는 차라리 고해(苦海)에 어울리는 고요가 흘렀다. 그런 고요 속에서 나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하였으며, 무슨 죄를 지었는가. 배부른 노예에서 배고픈 자유인의 삶을 선택했다는, 나는 진실한가.
김종철 시인(1947-2014)은 “휘어진 못을 뽑는 것은 / 여간 어렵지 않다"(「고백성사」)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뿌리깊이 박힌 내 삶의 ‘못대가리’를 제대로 빼낼 수 있을 것인가. 원한과 분노와 고통과 슬픔과 희망과 공포의 못대가리를 정말 빼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 이 맑은 날의 하늘과 바람과 물과 신록과 같이 진정 ‘스스로 그러한’ 자재(自在)의 기운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시인의 말처럼 내게도 어느 순간 “숨겨 둔 못대가리 하나가 쓰윽 고개를 내밀"것만 같은 불안감이 일었다.
그러나 판공성사를 받고 나오는 하늘은 더욱 맑았다. 시간은 이미 1시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배고픈 줄도 모른 채 한걸음에 을지로입구역으로 갔다. 덜컹대는 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횡성으로 달려 왔다. 안흥에서 내려 칼국수 한 그릇을 뚝딱 먹어치운 다음 다시 농어촌버스를 탔다. 그리고 강림에서 걸어서 30분 만에 작업실에 도착했다.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지은 죄가 사라질 수 없듯이, 죄를 반성하는 마음만으로 앞날의 죄까지 모두 막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며, 죄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할 것이다. 그것이 ‘반성하는 영혼’에 충실한 삶, 어쩌면 가장 인간다운 삶인지 모른다.
저 산마루 위 빛나는 태양은 그곳에서 계속 빛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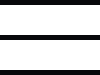


















.jpg)










독자댓글 총0건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