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 앞에 섰다.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크기에 압도되었다. 가로 4m, 세로 6m가 넘는 크기의 화폭에 모든 인물들이 살아있는 듯 표현되어 있었다. 440년 전에 그려진 그림 한 점을 보기 위해 20시간을 날아서 온 나는 그 거대한 아우라 앞에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다"
70년대 중반, 티브이에서 보았던 만화영화 ‘플란다스의 개’는 비극적인 결말로 어린 내게 충격을 주었다. 화가를 꿈꾸던 착하고 재능 많은 네로(원작의 표현대로라면 넬로가 맞다)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당하고 누명을 쓰고, 살던 집에서 쫓겨난 후 평소에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그림이 걸려있는 성당에서 자신의 충견 파트라슈와 얼어 죽는 결말은 내겐 그저 새드 앤딩 이상의 것이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그림은 440년 전 태어난 플랑드르 출신의 화가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였다.)
네로와 같은 꿈을 가졌던 나는 주인공 네로에게 감정이입을 많이 했던 모양이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충격의 트라우마가 꽤 오래 지속되었다. 그 이후로 나의 마음 한편엔 언젠가 네로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그 작품을 직접 보고 싶다는 소망이 자리 잡았다.
40대를 마무리하던 12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내린 짧은 여행 계획이 그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내적 충동의 발로였다는 것을 벨기에행(行) 비행기가 활주로를 막 박차고 떠오르던 순간 깨달았다. 40여 년 만에 이루게 된 꿈이었다.
네로와 같은 꿈을 가졌던 나는 주인공 네로에게 감정이입을 많이 했던 모양이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충격의 트라우마가 꽤 오래 지속되었다. 그 이후로 나의 마음 한편엔 언젠가 네로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그 작품을 직접 보고 싶다는 소망이 자리 잡았다.
40대를 마무리하던 12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내린 짧은 여행 계획이 그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내적 충동의 발로였다는 것을 벨기에행(行) 비행기가 활주로를 막 박차고 떠오르던 순간 깨달았다. 40여 년 만에 이루게 된 꿈이었다.
| 런던 히드로공항을 경유해 벨기에로 가는 영국항공. |
우리에게 익숙한 만화영화 ‘플란다스의 개’는 일본 작품으로 영국 여류작가가 쓴 동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이야기의 배경이 된 곳이 플란더스 즉 플랑드르 지역으로 현재 벨기에의 북부 도시 안트베르펜이고 그림이 걸려 있는 곳은 성모마리아성당이다. 만화영화 때문이겠지만 이곳을 가장 많이 찾는 관광객은 바로 일본인들이다. 그래서인지 일본 자동차 회사 도요타가 성모마리아성당 앞에 네로와 파트라슈의 동상을 기증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다.
| ‘손을 던지다’에서 유래한 지명 ‘안트베르펜’(사진 왼쪽). 일본 도요타가 기증한 성모마리아성당 앞의 네로와 파트라슈 동상. |
안트베르펜을 방문한 그 날은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유럽 일부에 4년 만에 내린 폭설로 온통 난리가 난 상황이었다. 눈길을 뚫고 도착한 성모마리아성당, 입장료를 받기 위해 전당포 부스 같은 곳에 앉아있던 수염 덥수룩한 할아버지에게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 드디어 왔어요~ 얼마나 오고 싶었는지 몰라요!"라고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신용카드를 건네자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현찰만 가능하다고 한다. 아무렴 어떠랴. 주섬주섬 지폐를 꺼내 건네자 입장권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라'는 따뜻한 말을 얹어 잔돈을 내어준다.
| 페테르 파울 루벤스(1577~1640)의 자화상. |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간 성당엔 네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그림인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 외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성당이 주는 엄숙함과 하나하나 공들여 전시한 그림들 덕분에 다른 미술관에서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드디어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 앞에 섰다.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크기에 압도되었다. 가로 4m, 세로 6m가 넘는 크기의 화폭에 모든 인물들이 살아있는 듯 표현되어 있었다. 440년 전에 그려진 그림 한 점을 보기 위해 20시간을 날아서 온 나는 그 거대한 아우라 앞에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루벤스의 그림들은 그 크기만으로도 보는 이의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440여 년간 이 그림 앞을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이 그림 앞에 섰을 것이고, 이 그림은 고스란히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품고 있을 것이다.
스탕달이 보고 무릎이 꺾이는 경험을 했다는 그림은 귀도 레니의 '베아트리체 첸지'가 아니라 산타크로체 성당의 프레스코 벽화였을 것이라고 한다. 일단 ‘베아트리체 첸지’는 산타크로체성당이 아닌 루브르에 있으니 일단 소장처를 찾아보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잘못이고,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을 점령하고 있음은 물론 TV프로그램으로 까지 만들어 전파되었으니 글을 쓰거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드디어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 앞에 섰다.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크기에 압도되었다. 가로 4m, 세로 6m가 넘는 크기의 화폭에 모든 인물들이 살아있는 듯 표현되어 있었다. 440년 전에 그려진 그림 한 점을 보기 위해 20시간을 날아서 온 나는 그 거대한 아우라 앞에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루벤스의 그림들은 그 크기만으로도 보는 이의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440여 년간 이 그림 앞을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이 그림 앞에 섰을 것이고, 이 그림은 고스란히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품고 있을 것이다.
스탕달이 보고 무릎이 꺾이는 경험을 했다는 그림은 귀도 레니의 '베아트리체 첸지'가 아니라 산타크로체 성당의 프레스코 벽화였을 것이라고 한다. 일단 ‘베아트리체 첸지’는 산타크로체성당이 아닌 루브르에 있으니 일단 소장처를 찾아보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잘못이고,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을 점령하고 있음은 물론 TV프로그램으로 까지 만들어 전파되었으니 글을 쓰거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 아! 아! 어쩌란 말이냐, 예수의 옆구리에 낭자한 피와 사도 요한의 피같은 붉은 옷이 루벤스 특유의 피부표현과 대비되어 더욱 드라마틱하게 느껴진다. |
한 지인이 말하길 본인은 그림 감상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었지만 외국여행 중 우연히 들른 미술관에서 재미있는 경험을 하고 그 이후로 미술관에 가는 재미를 붙였다고 한다. 그는 당시 미술작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에 작품을 감상하기보다 그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사람들을 감상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외국 사람들은 한 그림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매우 길었고, 다들 손에 책을 들고 있더란다. 그림 한 번 보고 책을 한참 읽고, 다시 그림을 보고 책을 보고. 모두들 진지하게 그림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지인은 바로 도록을 한 권 구입해서 그림 하나하나를 이해하며 다시 바라보니 그림이 달라 보이더라고 했다.
그림 감상하는 법에 왕도가 있을까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는 만큼 보이고, 알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연히 어린 시절 접했던 만화영화 때문에 루벤스라는 화가를 알게 되었고, 알고 나니 더 궁금해졌고,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공부하다 보니 그만 사랑하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이 즐겁다. 기다림의 설렘, 만남의 기쁨 이런 것들이야 말로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감정이다. 그런데 나이 들어 갈수록 설렘과 기쁨은 점점 자취를 감춘다. 사랑이란 글자로만 존재하는 감정이 되어버리고 ‘인생 뭐 있어?’ 라며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 삶 속에 사랑이 주는 설렘과 기쁨 사라질 때 우리는 ‘노땅, 꼰대’가 되고 마는 것이다. 나아가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고 말한 노희경 작가의 기준대로라면 노땅과 꼰대는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내 삶 속에 예술이 들어오게 하자. 미술이어도 좋고 음악이어도 좋다. 440년 전 살았던 화가를, 작곡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회에서 지탄받을 일은 없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한 해 열심히 일하고 짧지만 시간을 내어 그들이 살았던 곳, 그들이 남겨놓은 것들을 찾아가자. 한국이어도 좋고 좀 더 먼 곳이어도 좋다. 기다림의 설렘과 만남의 기쁨을 내 삶 속에 다시 생기게 하는 일, 그것이야 말로 예술이 가진 불멸성을 내 삶에 적용하여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그림 감상하는 법에 왕도가 있을까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는 만큼 보이고, 알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연히 어린 시절 접했던 만화영화 때문에 루벤스라는 화가를 알게 되었고, 알고 나니 더 궁금해졌고,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공부하다 보니 그만 사랑하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이 즐겁다. 기다림의 설렘, 만남의 기쁨 이런 것들이야 말로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감정이다. 그런데 나이 들어 갈수록 설렘과 기쁨은 점점 자취를 감춘다. 사랑이란 글자로만 존재하는 감정이 되어버리고 ‘인생 뭐 있어?’ 라며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 삶 속에 사랑이 주는 설렘과 기쁨 사라질 때 우리는 ‘노땅, 꼰대’가 되고 마는 것이다. 나아가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고 말한 노희경 작가의 기준대로라면 노땅과 꼰대는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내 삶 속에 예술이 들어오게 하자. 미술이어도 좋고 음악이어도 좋다. 440년 전 살았던 화가를, 작곡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회에서 지탄받을 일은 없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한 해 열심히 일하고 짧지만 시간을 내어 그들이 살았던 곳, 그들이 남겨놓은 것들을 찾아가자. 한국이어도 좋고 좀 더 먼 곳이어도 좋다. 기다림의 설렘과 만남의 기쁨을 내 삶 속에 다시 생기게 하는 일, 그것이야 말로 예술이 가진 불멸성을 내 삶에 적용하여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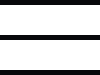
















.jpg)


.jpg)
독자댓글 총0건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