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기초자치단체가 올해 97곳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내년에는 100곳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최근 밝힌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서 “올해 10월(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 지역은 97개로 전체의 42.5%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3년 75개에서 지난해 89개로 5년간 연평균 2.8개씩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8개가 늘어 증가 속도가 2.8배 빨라졌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눈 수치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현재 구성원이자 미래 인구 구성에 영향을 미칠 여성 인구가 고령인구 절반에 못 미치는 0.5 미만일 때를 '소멸 위험' 수준으로 분류했다. 인구 재생산 주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해당 공동체 인구 기반은 붕괴하고 사회경제적 기능을 상실한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에서도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에 해당하고 0.2~0.5 미만일 땐 '소멸위험 진입' 단계로 본다. 올해 10월 기준 소멸 위험 97개 시·군·구 중 16곳은 고위험, 81곳은 소멸위험에 진입했다.
올해 소멸 위험 단계에 새로 진입한 지역은 전북 완주, 충북 음성과 제천, 부산 서구, 강원도 동해와 화천, 경기도 여주, 경남 사천시 등 8곳이다. 전남 부안(0.500)과 인천 동구(0.503), 강원도 인제(0.507) 등은 소멸 위험 진입 직전 경계 지역이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18개 시·도 중 전남이 0.44로 가장 낮아 유일하게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경북은 현재 0.501로 연말 소멸 위험 단계 진입이 예상된다. 전북(0.53)과 강원(0.54), 충남(0.63), 충북(0.68), 부산(0.69), 경남(0.70), 대구(0.80), 제주(0.81) 등 8개 지역도 주의(0.5~1.0) 단계에 해당해 비수도권 모든 도 지역의 소멸 위험 지수가 1을 밑돌았다. 전국 평균도 0.84로 1이 채 안 됐으며 가장 높은 곳은 1.56을 기록한 세종이었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은 대체로 여성 인구 유출과 초등학생 수 감소 영향이 있었다. 소멸 고위험 지역 시·군·구 의 경우 2012년 대비 2016년 20~39세 여성 인구 22.8%(2만1730명 중 4950명) 순유출이 발생했다. 2011년 대비 2016년 초등학교 학생 수는 23.7% 줄어 지역 내 초등교육기반이 약화됐다. 그 결과 1인 가구와 빈집은 늘고 지방재정은 악화됐으며 일자리 감소와 지역 산업은 쇠퇴 등을 경험하고 있다.
2015년 소멸고위험지역의 빈집비율은 15.9%로 전국 평균(6.6%)을 크게 웃돌았다. 1인 가구 비율도 35.6%로 전체 평균(29.5%)보다 높았다. 소멸 위험이 높을수록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았는데 2017년 소멸위험지역 평균 재정자립도는 16.6%였고 고위험지역은 이보다 낮은 13.2%에 불과했다. 정상 지역 39.1%와 비교하면 최대 3분의 1 수준이다.
2010년 대비 2015년 전국적으로는 취업자가 7.9% 증가했으나 소멸 고위험 지역에선 유일하게 3.2% 감소했다. 2013~2017년 고용위기지역에서 총 3만5395명이 유출됐는데 순유출인원 중 63.3%인 2만2407명은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지역소멸위험에 대한 대응전략에 있어 중앙과 지역 모두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과 경험이 부족했다"며 "지역소멸위험지역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서비스산업, 괜찮은 일자리와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 여성중심, 공동체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추진 전략으로 인구감소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공동체 대상 교육·복지·일자리·문화 연계 지역발전모델 창출을 제안했다. 시·군·구 중 인구규모 하위 25%(인구가 감소한 지역)와 최근 5년간 인구 감소율 상위 25%(인구 감소 중인 지역), 고령인구 대비 청년인구 하위 25%(지방소멸위험지수) 등을 지정해 5~7년간 15~20개 시·군을 집중 지원하자는 얘기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의료, 복지, 교육, 일자리, 문화 등의 접근성을 제고해 아동, 청년, 여성 친화적인 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규제완화 특구형태로 지원 가능한 정책사업 목록을 리스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눈 수치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현재 구성원이자 미래 인구 구성에 영향을 미칠 여성 인구가 고령인구 절반에 못 미치는 0.5 미만일 때를 '소멸 위험' 수준으로 분류했다. 인구 재생산 주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해당 공동체 인구 기반은 붕괴하고 사회경제적 기능을 상실한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에서도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에 해당하고 0.2~0.5 미만일 땐 '소멸위험 진입' 단계로 본다. 올해 10월 기준 소멸 위험 97개 시·군·구 중 16곳은 고위험, 81곳은 소멸위험에 진입했다.
올해 소멸 위험 단계에 새로 진입한 지역은 전북 완주, 충북 음성과 제천, 부산 서구, 강원도 동해와 화천, 경기도 여주, 경남 사천시 등 8곳이다. 전남 부안(0.500)과 인천 동구(0.503), 강원도 인제(0.507) 등은 소멸 위험 진입 직전 경계 지역이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18개 시·도 중 전남이 0.44로 가장 낮아 유일하게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경북은 현재 0.501로 연말 소멸 위험 단계 진입이 예상된다. 전북(0.53)과 강원(0.54), 충남(0.63), 충북(0.68), 부산(0.69), 경남(0.70), 대구(0.80), 제주(0.81) 등 8개 지역도 주의(0.5~1.0) 단계에 해당해 비수도권 모든 도 지역의 소멸 위험 지수가 1을 밑돌았다. 전국 평균도 0.84로 1이 채 안 됐으며 가장 높은 곳은 1.56을 기록한 세종이었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은 대체로 여성 인구 유출과 초등학생 수 감소 영향이 있었다. 소멸 고위험 지역 시·군·구 의 경우 2012년 대비 2016년 20~39세 여성 인구 22.8%(2만1730명 중 4950명) 순유출이 발생했다. 2011년 대비 2016년 초등학교 학생 수는 23.7% 줄어 지역 내 초등교육기반이 약화됐다. 그 결과 1인 가구와 빈집은 늘고 지방재정은 악화됐으며 일자리 감소와 지역 산업은 쇠퇴 등을 경험하고 있다.
2015년 소멸고위험지역의 빈집비율은 15.9%로 전국 평균(6.6%)을 크게 웃돌았다. 1인 가구 비율도 35.6%로 전체 평균(29.5%)보다 높았다. 소멸 위험이 높을수록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았는데 2017년 소멸위험지역 평균 재정자립도는 16.6%였고 고위험지역은 이보다 낮은 13.2%에 불과했다. 정상 지역 39.1%와 비교하면 최대 3분의 1 수준이다.
2010년 대비 2015년 전국적으로는 취업자가 7.9% 증가했으나 소멸 고위험 지역에선 유일하게 3.2% 감소했다. 2013~2017년 고용위기지역에서 총 3만5395명이 유출됐는데 순유출인원 중 63.3%인 2만2407명은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지역소멸위험에 대한 대응전략에 있어 중앙과 지역 모두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과 경험이 부족했다"며 "지역소멸위험지역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서비스산업, 괜찮은 일자리와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 여성중심, 공동체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추진 전략으로 인구감소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공동체 대상 교육·복지·일자리·문화 연계 지역발전모델 창출을 제안했다. 시·군·구 중 인구규모 하위 25%(인구가 감소한 지역)와 최근 5년간 인구 감소율 상위 25%(인구 감소 중인 지역), 고령인구 대비 청년인구 하위 25%(지방소멸위험지수) 등을 지정해 5~7년간 15~20개 시·군을 집중 지원하자는 얘기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의료, 복지, 교육, 일자리, 문화 등의 접근성을 제고해 아동, 청년, 여성 친화적인 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규제완화 특구형태로 지원 가능한 정책사업 목록을 리스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역 저출산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올해 출산지원사업의 예산 규모가 지난해 2600억원에서 3280억원으로 1년 사이 20.7%늘어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체 243곳 지자체 중 224곳에서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원수단으로는 '현금'(5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을 보면 기초·광역 지자체 모두에서 사업 추진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녀 출생 순위에 따른 지원 비율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기초·광역 지자체들이 셋째 이상일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금액에 대한 지자체 간 편차도 매우 컸다. 출산지원금의 경우 광역 지자체는 최저 10만원~최고 1440만원, 기초 지자체는 최저 5만원~최고 700만원으로 2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출산의 경우 광역 지자체는 최저 20만원~최고 1440만원, 기초 지자체는 최저 5만원~최고 1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셋째 출산의 경우 가장 높은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 지자체에서는 최저 30만원~최고 1440만원, 기초 지자체들은 최저 10만원~최고 26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지자체들은 '저출산정책'이 주로 출산지원금으로 진행되는 이유로 '지역주민 선호도 또는 요구'(85.7%)를 1위로 꼽았다. '현금 지원사업 추진 주요 목적'으로는 ▲출산장려 문화 확산(85.7%) ▲출산육아 비용 부담 완화(82.9%) ▲인구 유출방지 및 유입 유도(55.6%) 등으로 답했다.
이처럼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한 선호와 비중은 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사업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에 의문성을 표했다. 이들은 '현금지원 저출산 정책이 필요없는 이유'로 ▲사업효과가 낮거나 없다(69.6%) ▲지자체간 과다 경쟁 지속화(66.0%)를 꼽았다.
현금성 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1001명 중 81.1%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70.7%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아울러 공무원 93.4%는 '현금 지원사업의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양미선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후 '저출산 시대 해법, 지역에 답이 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20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 발표한다. 이번 포럼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육아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체 243곳 지자체 중 224곳에서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원수단으로는 '현금'(5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을 보면 기초·광역 지자체 모두에서 사업 추진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녀 출생 순위에 따른 지원 비율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기초·광역 지자체들이 셋째 이상일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금액에 대한 지자체 간 편차도 매우 컸다. 출산지원금의 경우 광역 지자체는 최저 10만원~최고 1440만원, 기초 지자체는 최저 5만원~최고 700만원으로 2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출산의 경우 광역 지자체는 최저 20만원~최고 1440만원, 기초 지자체는 최저 5만원~최고 1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셋째 출산의 경우 가장 높은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 지자체에서는 최저 30만원~최고 1440만원, 기초 지자체들은 최저 10만원~최고 26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지자체들은 '저출산정책'이 주로 출산지원금으로 진행되는 이유로 '지역주민 선호도 또는 요구'(85.7%)를 1위로 꼽았다. '현금 지원사업 추진 주요 목적'으로는 ▲출산장려 문화 확산(85.7%) ▲출산육아 비용 부담 완화(82.9%) ▲인구 유출방지 및 유입 유도(55.6%) 등으로 답했다.
이처럼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한 선호와 비중은 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사업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에 의문성을 표했다. 이들은 '현금지원 저출산 정책이 필요없는 이유'로 ▲사업효과가 낮거나 없다(69.6%) ▲지자체간 과다 경쟁 지속화(66.0%)를 꼽았다.
현금성 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1001명 중 81.1%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70.7%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아울러 공무원 93.4%는 '현금 지원사업의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양미선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후 '저출산 시대 해법, 지역에 답이 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20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 발표한다. 이번 포럼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육아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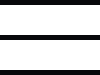











.jpg)


.jpg)
독자댓글 총0건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