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낙엽이 지고 가지만 남은 나무들(왼쪽)과 이동휘의 '대륙의 바람' 표지. |
낙엽(落葉)들이 길가에서 뒹군다. 그런 가운데서 기세등등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새로운 무기를 들고 ‘지구촌을 위협한다’는 뉴스가 불안감을 고조시킨다.
‘어디까지 가려는 것일까.’
메마른 나뭇가지 밑을 걸으면서 생각을 해본다.
‘거기에는 필시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있었을 것이다. 산업화로 삶이 풍족하고 편리해졌으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음이다.’
‘거기에는 필시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있었을 것이다. 산업화로 삶이 풍족하고 편리해졌으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음이다.’
‘레이첼 카슨(1907-1964)’의 책 <침묵의 봄, Silent Spring> (김은령 옮김)을 통해서 알아본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등장한 화학물질이 우리 환경을 삼켜버리며, 전혀 새로운 공중보건문제가 대두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천연두·콜레라·페스트 등이 나라 전체를 휩쓸어 버리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했다...오늘날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은 근대적 생활방식을 수용하면서 인간 스스로 초래한 새로운 형태의 환경오염이다.>
인간들의 잘못?
저자 ‘레이첼 카슨’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암에 대해서도 태양·폭풍·토양 등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것만은 틀림없다’고 했다. 다시 책속으로 들어가 본다.
<스프레이·분말·에어로졸 형태의 이런 화학제품들은 농장·정원·숲·가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해충’은 물론 ‘익충’까지도 모든 곤충을 무차별적으로 죽였다...노래하는 새와 시냇물에서 펄떡거리며 뛰놀던 물고기까지 침묵시켰다.>
화학물질이 ‘살충제’를 넘어 ‘살생제’가 된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서 지렁이의 중요성을 알았다.
<지렁이가 파놓은 구멍을 통해 토양에 공기가 공급되고 배수도 용이해지며, 식물도 뿌리를 자유롭게 뻗는다. 지렁이 덕에 토양 속 박테리아의 질소 화합 능력이 배가되며, 토양의 부식(腐蝕)도 줄어든다. 유기물은 지렁이의 소화관을 통해 분해되어 배출되는데, 이 분비물 덕분에 토양은 더욱 비옥해진다.>
고뇌의 삶을 사는 인간
<바람이 불어온다. 광막풍(廣漠風)이 불어온다. 한반도에 추위와 굶주림을 가져와 죽음으로까지 휩쓸 듯 몰아친다. 남풍이 일어나 불러오기 시작했다. 남풍 속에 생명의 물줄기가 대지를 적시고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휘(79)의 장편소설 <대륙의 바람>은 이렇게 시작된다. 중간부분에는 이러한 글도 있다.
<인간은 실존적인 고뇌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생명만을 지닌 일반 식물이나 동물과는 다르다. 동물들은 대개 과거를 생각하는 일이 없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은 매우 복잡한 사고(思考)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설의 테마는 6·25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복잡한 사고 때문일까. 동족간의 이념 대립이 치열하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설처럼 이념 전쟁을 하고 있다. ‘침묵의 봄’이 아닌 ‘생동하는 봄’을 기다려 본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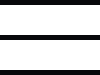




















독자댓글 총0건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