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화 "카핑 베토벤(Copying Beethoven, 2006)"중에서 | ||
“내가 2년 동안, 얼마나 고독하고 비참한 생활을 해왔는지 당신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지금까지 가급적 사람들을 피해가면서 살아 왔는데 지금은 다르다. 매력적인 한 여성이 내 곁에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고 있으며 나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 나의 청춘이 실제로 시작되는 것은 이제부터라고 생각이 든다. 아! 아! 인생을 천 번이라도 살아보고 싶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구구절절 애끊는 연정이 느껴지는 이 편지. 읽는 것만으로도 뜨거워진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천 번이라도 살아보고 싶다고 외쳤을까.
이 절절한 편지는 베토벤이 옛 친구 베겔러에게 썼다. 그는 옛 친구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며 삶을 천 번이라도 더 살고 싶다며 외쳤다. 그냥 살면 될 일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다. 마치 죽음으로의 도피를 간절히 소원하는 절규처럼.
누구였을까. 귓병으로 청력을 잃어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베토벤의 가슴을 이토록 불태운 여인이. 다름 아닌 보헤미아의 귀족 프란츠 요제프 귀차르디 백작의 딸 줄리에타였다. 그녀가 병든 청년 음악가의 가슴에 뿌리내린 마지막 불꽃이었을 거다. 아마도 베토벤은 그녀를 떠올리며 “사랑이 그 신비한 빛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 찬란한 손가락으로 내 영혼을 만졌을 때 그때 내 나이 서른이었다”를 하루에 수백 번 이상 속삭이듯 고백했을지 모른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적어도 베토벤은 귀가 멀고 있음에도 사랑 덕분에 열치 앞을 잊고 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
이 둘은 베토벤이 멀쩡할 때가 아닌, 귀가 멀면서부터 알게 되었다. 이들의 사랑이 사지육신 멀쩡한 젊음 안에서도 온갖 조건을 따지는 우리의 가슴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일이겠지만, 그때 그 시절 베토벤은 고독하고 두렵고 처절한 시간을 사랑으로 참고 극복했을 것이다. 참으로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정말이지 사랑이라는 것이 병과 죽음의 두려움까지 극복할 수 있는 불멸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무엇인 걸까. 들리지 않는 고통이 죽음을 연상케 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사랑이 그에게 삶 그 이상의 힘이 되었을 것이다.
베토벤의 32개 소나타는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익숙하다고 말할 정도로 유명하다. 그 중에서 ‘월광 소나타’는 웬만하면 한번 이상은 들어보았을 법한 곡이다. 하지만 이 곡이 죽음처럼 고통스런 병마 속에서 불멸의 사랑 속에서 작곡되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필자는 ‘월광 소나타’를 듣고 있으면 비갠 날 밤의 밝은 달이 떠오른다. 사실 불같은 사랑 코드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마치 백두산과 한라산의 거리만큼이나 이쪽과 저쪽인 듯 하다. ‘음악을 좀 안다’는 필자도 이 정도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차분하다못해 축축 늘어지는 멜로디와 리듬이 사랑을 노래했다고?”라며 반문할지 모른다.
사랑도 사랑 나름이다. 베토벤의 사랑은 달랐다. 적어도 힘을 연상케 하는 격정의 사랑은 아니었을 것이다.
‘월광 소나타’는 베토벤이 작곡한 소나타 중에서 가장 로맨틱한 감정이 넘치는 곡이라고 해석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이 곡을 작곡했을 당시의 베토벤이 겪은 고통과 사연을 뇌리에 떠올린다면 ’월광 소나타’는 견딤의 슬픔을 노래하는 사랑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청력을 잃어가며 병들고 있는 베토벤에게 사랑은 정열이 아니었을 것이다. 육체의 병을 사랑으로 잠시 잊으며 예술로 승화시키는 애절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다.
‘월광 소나타‘를 듣고 있노라면 시종일관 일정한 리듬이 되풀이 된다. 하지만 곳곳에 미묘한 격렬함을 숨기고 있는 묘한 곡이기도 하다. 달이 비치고 있는 잔잔한 호숫가가 연상되고, 잔잔한 물결이 순간적으로 일렁이는 듯하다.
월광(月光). 동양에서는 영원불멸과 풍요의 상징으로 달을 숭배했지만 서양은 달랐다. 태양을 숭상하는 서양에선 달은 어둠과 죽음의 상징이었다. 고대에선 달을 루나(Luna)라고 불렸으며, 영어로 광기에 찬 행동을 의미하는 ‘Lunacy’의 어원인 것만 봐도 서양인들이 얼마나 달을 두려워했는가를 알 수 있다. 베토벤은 병의 두려움을 달빛 아래 띄워진 쪽배처럼 그려냈다. 달이 없으면 쪽배는 어둠을 뚫고 강을 건너지 못한다. 달의 존재는 生이기도 하고 死이기도 한 셈. 쪽배에 타고 있는 베토벤은 동양인처럼 달에게 기도했을지 모른다. 천 번은 어불성설인지 안다. 백 번도 바라지 않는다. 이 생(生)에서라도 그녀와 함께 길게 사랑하고 싶다고.
솔직히 그 어떤 사랑인들 베토벤이 처한 사랑만큼 처절할 수 있을까. 아마도 흔치 않을 거다. 팍팍한 일상을 살면서 “사랑이 멀어진지 오래다”라고 외치는 부부들도 적지 않다. 하긴 그 누구인들 불같이 사랑하지 않았으며, 온갖 질타와 반대를 무릅쓰고 이뤄진 사랑이 아닐 수 있겠는가.
우리 주변의 사랑들은 시간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다. 절절하긴커녕, 싸늘하고 시니컬해져 버린다. 사랑이 산 너머 남촌이 되어 사는 부부도 많다. “결혼생활이 행복해요”라고 외치는 부부가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과 병마와 싸우며 사랑의 소중함을 느끼며 작곡을 하는 베토벤을 떠올리며 사랑을 해 보라는 게 아니다. 떠올린다고 해서 애틋해질 수도 없을테니 말이다.
한 번 즈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빛과 소금은 과연 누구일까?를 떠올려봐야 한다. 아무리 결혼생활이란 것이 별 것이 없는, 마치 하와이에 갔더니 비만 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시시함의 버전이라고 해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고, 소중한 이유가 있는 법. 간혹이라도(시시때때라면 더 좋다) 뜨거워지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인생에서 비를 같이 맞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불멸의 사랑은 없다. 물론 예술작품에서는 존재한다. 백마탄 왕자도, 착하고 예쁜 공주님도 동화 속에서만 존재하듯이 불멸의 사랑은 어쩌면 현대인이 기대하고 있는 로또복권 당첨의 대박의 꿈일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가슴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맞다. 설사 사랑의 불멸을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불멸의 사랑을 노래한 음악을 들으면서 떠올려보라고 권하고 싶다. 내 청춘을 이끈 사랑의 기승전결을. 만약 생활이 너무 심심하고 권태롭다면, 또 결혼이 내 인생의 불행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음악소리를 좀 더 높여보라.
사랑은 격정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랑을 지킬 수 있어야 사랑이다. 사랑의 화룡점정은 점을 찍지 않아야 맞지 않을까. 사랑은 끝이 없어야 된다. 불멸이 되려면 인고의 견딤과 희생이 동반되어야 한다. 단순하고도 심심한 반복의 선율이지만 불후의 명곡으로 인정받는 ‘월광소나타’가 이러한 사랑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지 모른다. 정제된 슬픔이 달빛 아래에서 사랑으로 승화되는 아름다움이랄까. 우리네 삶과 사랑을 닮았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축복”이라고 속삭여보라. 어쩌면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어깨가 들썩여지고, 아내의 허리춤이 리드미컬해질 수 있을지 모른다. 그 순간 사는 맛이 달라지고, 일상을 견디는 기가 터득이 될 거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가 바로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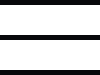













독자댓글 총0건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