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일명,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남성의 유족에게 국가와 병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40단독)은 2월 24일 메르스 104번 환자였던 A씨의 유족이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의 아내와 자녀 3명에게 총 1억2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 금액에서 국가와 공동해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2015년 5월 27일 아내와 함께 복통을 호소하는 아이를 데리고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이후 발열과 두통 증세 등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관련 신고를 했다. 그는 당시 이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있던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
이후 A씨는 그해 6월 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18일만인 6월 27일에 사망했다.
유족은 "국가와 병원이 메르스 사전 감염 예방과 노출 위험을 고지하는 등 사후 피해확대를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1억7200여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2015년 9월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 과실과 A씨의 메르스 감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번 환자의 접촉자에 관한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A씨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14번 환자도 조사될 수 있었다"며 "보건당국은 14번 환자 등이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김에 따라 메르스가 대규모로 확산됐음에도 14번 환자 접촉자 파악에서도 부실하게 역학조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14번 환자 확진일 다음날 A씨 등의 감염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사후 피해 확산을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당시 14번 환자를 메르스 의심환자나 접촉환자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다며 사전 감염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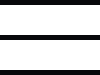














독자댓글 총0건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