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8)씨는 2011년 B(여)씨와 재혼을 하며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C(12)양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약속하고 친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를 밟았다.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법원의 심판을 받아 이듬해 10월 친양자 입양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재혼 생활은 2년여 만에 깨졌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A씨 역시 B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C양의 친권자를 B씨로 지정하며 A씨가 C양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로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C양을 상대로 파양(罷養) 소송을 냈다. C양과의 친양자 관계를 끊으려는 소송이다.
A씨는 B씨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돼 이혼에 이르게 됐고 C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가 지정될 것이 명백하며 자신과 C양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C양이 친양자로 적응하며 생활하기 어려움에도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C양의 복리를 크게 해치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파양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협의상 파양이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되며, 그 사유로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등 두 가지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친양자제도는 혼인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부가 양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친양자로 입양되면 이전까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생자로 기재된다.
이 제도는 재혼가정이 늘면서 배우자가 이전에 낳은 자녀를 입양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된다고 법조계 인사들이 전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친양자 입양 청구는 2012년 180건에서 2013년 220건, 지난해 266건, 올해 8월 12일까지 172건으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재혼하면서 쉽게 친양자 입양을 했다가 이혼하면서 파양 소송을 내는 경우 역시 조금씩 늘고 있다.
2009년부터 친양자 파양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해 그 해 판결이 1건 선고되던 것이 2013년 5건, 올해는 8월까지 7건 선고됐다.
민법상 파양 요건은 엄격하지만, 현실에서는 재혼했다가 이혼하는 부부들이 대부분 파양을 협의해 오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는 그동안 이런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려왔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친양자 파양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당사자 자녀가 파양을 원치 않은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혼할 때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고 쉽게 친양자 입양을 해놓고 부부관계가 깨졌다고 파양을 청구하게 되면 결국 아이의 상처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친양자 입양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서울=연합뉴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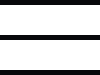









.jpg)

독자댓글 총0건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