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소? 그가 아무리 위대한 화가라도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다. 마티스는 그저 장식가일 뿐이다."라는 뷔페(Bernard Buffet, 1928-1999)의 말은 충격적이다. 뷔페를 모르면 몰랐지 피카소와 마티스는 대한민국의 미술 교육 현장에서 이미 오랫동안 가르쳐진 세기의 화가라는 점에서도 놀랍고, ‘아무 의미 없다’느니 ‘그저 장식가일 뿐’이라느니 동종 업계의 대선배들을 지칭하는 표현치고는 너무 과격한 점에서도 충격적이다.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만 해도 할아버지뻘인 47년 연상이고,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는 무려 59년 연차가 나는 대선배이다.
참다운 예술가란 제 어미를 먹이로 삼는다는 살무사와 같아서 언제나 전복일 수밖에 없다지만, 그렇다고 무차별적인 과도한 언사까지 모두 용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뷔페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다면 그것은 두 선배 화가에 대한 매우 과격한 부정적 정의로써 충격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 마티스의 색채감과 피카소의 해체적-구성적 표현법 등이 들어 있다는 점에서 그런 과격한 언사는 일종의 변형된 오마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나이차를 이유로 예의가 있니 없니 하는 것은 예술계에는 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뷔페는 한 발 더 나아간다. “사람들은 내게 거만하다 할지 모르지만, 이 캔버스를 보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라고 했다. 그의 자부심과 박력에 한계가 없다.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양으로 삼고, 상대를 높이는 언사를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습속은 예술계와 문단에도 널리 퍼져 있다. 월수입이 고작 수십 만 원밖에 되지 않고, 작품마저 극소수 동료들만이 알아주는 무명 시인일지라도 참다운 시인이라면 그에게는 온 세계와 온 우주가 들어 있다. 시인이라면 자부심과 긍지만큼은 뷔페와 같은 극강(極强)일 수밖에 없다. 시인은 오직 그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간의 습속은 그런 시인마저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게 한다는 점에서 뷔페의 ‘맛’은 특별하다.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은 “내가 인정하는 프랑스 회화의 마지막 거장은 베르나르 뷔페"라고 했다. ‘마지막’이라는 말도 유구한 회화사의 미래를 염두에 둘 때 인정하기 어렵지만, 뷔페를 ‘마지막 거장’이라고 지정한 것은 어쩌면 서양식 겸양인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뷔페는 자신을 최고로 여길 줄 아는 화가였다는 사실이다. 그의 작품을 관람하는 내내 자극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 자부심이었다. 어쩌면 예술이란 안하무인의 자긍심으로 절대적 위민(爲民)을 추구하는 휴머니즘이 아니겠는가. 뷔페는 피카소를 두고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다."고 했고, 마티스를 두고 “그저 장식가일 뿐"이라고 했다. 그것이 뷔페의 ‘참맛’이었다.
그날 한여름의 예술의전당은 푹푹 찌는 열기로 인해 근처 사람들을 안으로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섭씨 35도를 오르내리는 기온에다 포장도로의 지열까지 더해져 횡단보도 앞에서 잠깐 신호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에도 온몸은 땀으로 젖어들었다.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없는 만큼 실내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였다. 한국에서 처음 열린 베르나르 뷔페의 대규모 회고전이라서가 아니라 분명 날씨 탓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시장 내부는 더욱 붐볐다. 여유 있는 세밀한 관람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관람객이 들어 있었다. 그렇다면 뷔페는 역시 뷔페였던가. ‘20세기 구상회화의 왕자’라는 수식어나 피카소와 마티스를 일거에 군소 화가로 참칭한 배짱 때문이었던가.
한 마디로 대단한 호응이었다. 관객들의 어깨가 부딪칠 정도였다. 관람 열기 또한 진지하고 뜨거웠다. 크고 작은 작품마다 겹겹이 둘러서서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집중했다. 2차 대전 직후 그려진 초기작의 가늘고 길고 컴컴한 스타일에서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원색의 화려한 색감과 만화적이거나 디자인에 근접한 듯한 화풍까지 뷔페의 다양한 스펙트럼 위에서 관객들은 즐거워했다. 잘생긴 외모와 그보다 더 잘생긴 연인 아나벨(Annabel Buffet, 1928- )의 다정한 모습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마저 관객들은 열심히 살펴보았다.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뷔페의 두둑한 배짱일지 모른다. 앞선 문인들의 노작들을 사숙(私淑)하면서도 거기에 주눅 들지 않는 당당한 의욕과 정당한 전복에의 열정을 지켜 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모른다. 시로써 온 세상을 아우르고, 시로써 온 우주를 덮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터럭만큼이라도 사람에게 이로운 어떤 시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겉과 속이 다른 텅 빈 찬사와 무차별적인 호평을 예의와 겸양으로 미화하지 않는 솔직하고 대범한 자세가 필요하다. 속 좁은 예의와 겸양은 시단(詩壇)의 건강한 소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옹졸하고 자잘한 시인들만 낳는다. 그런 태도는 자신마저 갉아먹는 좀과도 같다.
만일 우리가 뷔페를 보아야 한다면, 그것은 그가 평생 동안 가꾸어낸 다양하고 화려하고 섬세하고 자극적인 화폭이 아닐지 모른다. 앵글이 아니라 앵글 배태한 그의 내면(fond interieur), 열정적 학습과 질투와 시기와 용서와 사랑과 슬픔으로 충만한 그의 안쪽일지 모른다. “광대… 이것은 두려움이다. 그는 그의 얼굴에 그림을 그린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추악함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아, 슬프구나." 뷔페는 광대를 그렸다. 광대를 그리는 광대가 진정한 화가라는 의식을 하는 순간 뷔페는 자기 자부심의 근거를 돋을새김 한 셈이었다.
뷔페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수년 전 한 인터뷰에서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어제와 하나뿐인 오늘이 있다. 그러나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1994년)고 말했다. 과거에 대한 인식과 오늘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돋보이는 이 말은, 그러나 미구(未久)에 닥칠 죽음을 당당하게 응접하는 것을 포기한 늙은 파킨슨병 환자의 부당한 논리로 보인다. 내일은 앎이나 모름이라는 인식론적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내일은, ‘다음’이라는 물리적 범주이거나 ‘다름’이라는 윤리적 범주에 가깝다.
만일 뷔페의 말처럼 내일이란 결국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면, 내일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모르는 것이란 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도 뷔페는 애써 내일을 부정함으로써 현재를 정당화하고, 그 현재와의 인위적인 결별을 옹호하려 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그것은 젊은 뷔페가 마티스와 피카소를 무참히 짓밟은 것과 같이 늙은 뷔페가 스스로를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자부심과 긍지를 지켜내려 한 것이었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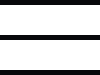
















독자댓글 총0건 댓글 쓰기